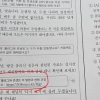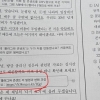<19>93년생 소설가 강대호

오경진 기자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대호 소설가는 “문장을 부수는, 정말 실험적인 소설을 써 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얼마 전 문학과지성사에서 두 번째 소설집 ‘혹은 가로놓인 꿈들’을 펴낸 소설가 강대호(31)를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 소설에 대한 인상을 솔직하게 전했더니, 그가 씩 웃는다.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한 것처럼, 그는 쑥스럽게 대답을 이어 갔다.
“언젠가부터 ‘이야기’가 그리 재밌지 않더라고요. 사고 실험을 하듯 소설을 썼어요. 독자와 그걸 같이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죠. 너무 힘들게 읽으실 것을 알지만…. 글을 쓸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곤 하잖아요. 지금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게 누구인지. 나인지, 아니면 예전에 읽었던 책의 저자인지. 그런 의문을 환기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땐 판타지를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덜컥 소설을 쓰겠다고 맘먹었는데 문예창작을 전공하면서는 잠시 시를 쓸까, 마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단다.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평론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으니, 거의 ‘문학 올라운더’인 셈이다. 어쩌면 소설을 쓰고 있지만, 장르의 구분은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작품이 소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으니까. 그의 첫 번째 소설집 ‘스핀오프’를 출간했던 출판사 문학실험실은 “강대호의 소설은 상업화의 시류를 역행한다”고 쓰기도 했다. 책을 팔아야 하는 출판사로서는 무척 ‘담대한’ 문장이다.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최대한 잘 읽히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웃음). 당연히 판매됐으면 좋겠고 불특정 독자에게 가닿길 원해요. 그러려면 상업의 창구를 반드시 통해야겠죠. 어느 물결에 올라타면서도 그 밑에 발을 딛고 있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 물결 안에서 생기는 불규칙과 긴장감, 불화를 느끼려고 해요. 상업이라는 틀 안에서 상업을 배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학평론가 전청림은 그의 소설에 대고 “고정된 착각을 의심하는 철학자처럼 끈질기게 언어의 꿈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붙일 뿐”이라고 평했다. 멋진 말이지만, 궁금증이 증폭되기도 한다. ‘언어의 꿈’이란 무엇인가. ‘언어가’ 꾸는 꿈인가, ‘언어로’ 꾸는 꿈인가. 언어로 꾸지 않는 꿈도 있는가. 기자가 헤매고 있는 사이 소설가가 멋진 비유를 들어 줬다.
“언어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은 내 것이지만 계속 빠지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도 나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온전히 내 것은 아닙니다. 언어가 온전한 나의 소유라면, 타인과 소통할 여지도 없는 거겠죠. 문학이 독자에게 가닿을 수도 없겠고요.”
소설을 읽을 땐 아득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맑아진 것 같다. 마치 관념의 세계에서 정다운 산책을 한 기분이랄까. 그에게 독자란 무엇인지 물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타인. 저도 독자도 서로 만나면 실망할걸요. 하지만 그렇기에 계속 말을 걸 수 있겠습니다. 서로 영원히 모르기에 소설은 영영 끝나지 않겠죠.”
2024-07-0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