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하지 않은 불륜극, 그러나 아쉬운 뒷심
소영(신은경·오른쪽)은 행복했다. 잘나가는 산부인과 의사에, 남편 지석(정준호)은 대학 교수다. 남편과의 사랑도 완벽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내연녀 수지(심이영·왼쪽)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소영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진다. 소영은 수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살핀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관계는 이상해진다. 처음 품었던 적개심은 점차 수지에 대한 이해와 연민으로 변하고, 어느새 수지를 보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일반적인 불륜 드라마의 특징은 감정선이 심하게 편향돼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 드라마가 편드는 캐릭터에 감정선을 집중시킨다. 내연녀 편을 들면 본처가 악녀고, 조강지처 편을 든다면 정부(情婦)가 팜므파탈이다. 최근 막장 열풍 탓에 복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감정선은 더욱 단순하고 노골화된다. ‘감정선 양극화’는 최근 대중문화 콘텐츠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면에서 18일 개봉한 영화 ‘두 여자’는 발전적이다. 감정 분배에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칼자루를 쥔 소영은 내연녀와 남편 가운데 누구의 심장을 찌를지 고민하는 원초적 캐릭터로 보여질 듯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악역을 누구로 만들지, 누구에게 복수를 해야 더 효과적일지 혈안이 된 영화는 아니란 얘기다.
특히 영화는 감정선을 다양한 층위로 엮어내고 있다. 복수에 대한 갈망은 물론 남편을 빼앗은 여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남편의 가혹한 품평을 듣고야 마는 피학적 관음증, 여기에 수지에 대한 동정 등 수많은 감정이 뒤엉키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또 수지의 감정에 대해서도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 관객의 심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든다. 누구에게 욕을 해야 하는지 강요하는 억지가 없는, 조금은 사려 깊은 불륜 영화다.
그렇다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감독의 면면을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2007), ‘아내가 결혼했다’(2008)의 정윤수 감독이다. 그의 말로 메시지를 대신한다. “우리는 욕망의 표현이 자유로워지는, 위험한 관계가 만연한 곳에 살고 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없이 제도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었다.”
하지만 독특한 설정과 섬세한 심리 묘사는 결국 영화 후반부에서 한계에 부닥치며 빛을 발하지 못했다. 갑작스레 극단으로 치닫는 어색함이 전반부와 뚜렷이 대비되면서 균형을 잃는다.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 치정극의 전형성을 그대로 답습한다. 역시 피로 마무리되는 설정. 야한 통속극에 그치면 안 된다는 의무감은 강해 보이는데, 황급한 걸음으로 인해 개연성은 추락한다.
마케팅이 너무 에로티즘에 편향된 점도 아쉽다. 물론 노출 수위만 봤을 때 최근 나온 한국 영화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강한 편이지만, 그 이외의 메시지가 퇴색돼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청소년 관람불가.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11-19 2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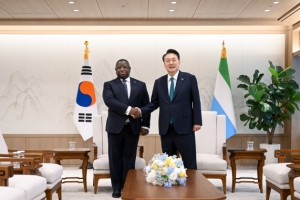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