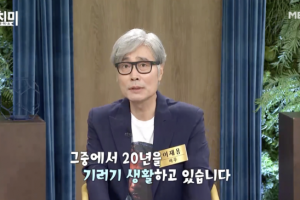찾는 이 없어도 800년 오롯이… 晩秋(만추)에 젖다
단풍에도 차례가 있고, 낙엽에도 순서가 있다. 작은 나무가 먼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가을을 알리고 낙엽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덩치 큰 나무들은 그제야 서서히 속살을 드러내며 고운 단풍을 보여준다. 나무 줄기와 잎에서 물기가 빠져야 단풍이 드는 법인데, 몸피가 굵을수록 제 몸의 물을 덜어내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때문이다. 일교차가 크고 햇살이 좋아야 단풍이 더 곱고 화려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봄부터 가을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물만큼 필요한 게 없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물을 덜어내야 한다. 기온이 떨어져 물이 얼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단풍은 결국 몸 안의 물을 덜어내고 겨울을 무사히 지내려는 나무의 생존 전략이 빚어낸 겨울 채비인 셈이다.

세월이 흐르고 나무 곁의 사람살이가 달라져도 800년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살아온 나무의 아름다움은 여전하다. 다섯 개로 고르게 갈라져 솟아오른 장수동 은행나무의 줄기가 싱그럽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울긋불긋한 낙엽이 거리를 뒹굴자 큰 나무의 단풍이 궁금해 안절부절못하고 길을 나섰다. 큰 나무들이라면 아직 낙엽은커녕 단풍도 덜 들었으리라는 짐작은 있었지만, 나무의 시간을 사람의 마음으로 가늠하는 건 언제나 불가능한 탓에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를 찾아 길을 재우쳤다.
짐작대로 단풍은 아직 덜 들었다. 햇살 더 많이 받는 위쪽 은행잎에 든 노란 단풍은 선명했지만, 땅 위에 선 사람의 가까운 쪽에는 여전히 초록의 은행잎이 남아있었다. 겉으로는 매운 바람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속으로만 삶의 무게를 덜어내려 바쁘게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도심 한가운데서 겨울 채비로 분주
평일 낮이었지만, 언제나처럼 장수동 은행나무를 찾아온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은행나무 그늘 짙게 드리운 텃밭에는 칠순쯤 돼 보이는 노인이 한 해 동안 공들여 키운 배추를 돌보느라 분주하다. 노인은 지나는 사람들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개 한번 돌리지 않는다.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성가시다는 듯, 이내 눈길을 돌린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까닭이다.
노인에게 다가가 ‘예년처럼 올해도 은행나무 동제를 지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데면데면하던 노인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노인은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아예 허리를 펴고 일어난다.
“물론이지. 해마다 칠월 초하루에 목신제를 지내. 나는 스무살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그때부터 계속했어. 옛날처럼 농악패가 길굿까지 하는 건 아니어도 그냥 넘기는 법은 없지. 도시에서 이렇게 목신제를 지내는 데는 아마 없을걸.”
목신제를 지낼 때에는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노인은 빼놓지 않는다. 은행나무 목신제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800년 동안 마을의 수호신으로 살아
은행나무는 80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로 살았다. 나무에 제를 올리는 풍경에야 적잖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무는 예나 지금이나 마을의 수호신이다. 옛날에는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큰 병이 돌면 나무 앞에 제물을 차려 놓고 치성을 드렸다. 얼마 전까지 나무에는 소속을 알 수 없는 무속인들도 찾아와 제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리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그런 예스러운 풍경은 사라지고, 해마다 칠월 초하루에만 목신제를 올린다. 키가 30m나 되는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뿌리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다섯개로 고르게 갈라지면서 높지거니 솟아올랐다. 나뭇가지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진 생김새도 여느 은행나무와는 사뭇 다른 특징이다. 나뭇가지가 펼친 품은 사방으로 25m 넘게 고르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만큼 훌륭한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장수동 은행나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건 1992년에 인천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면서부터였다. 그때만 해도 나무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무의 가치를 먼저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이 이 나무의 존재를 꾸준히 알렸다. 더 오래 잘 보존하자는 뜻에서였다.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스스로 은행나무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도 있었고, 수시로 나무의 변화를 정성스러운 사진과 글로 일일이 알린 사람도 있었다. 나 역시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나무는 널리 알려졌고, 찾아오는 사람도 따라서 늘어났다. 나무 주위의 한적한 풍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변화를 겪어야 했다. 먼저 나무 곁에 식당이 들어섰다. 식당이라 해봐야 나무 옆 골목 안쪽의 허름한 칼국수 집 하나가 전부였던 풍경은 차츰 번화한 도심의 관광지 풍경을 닮아갔다. 천막을 친 간이식당이 생기더니, 차츰 제법 그럴싸한 간판을 내건 식당이 지어졌다.
●풍경 바뀌어도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워
나무 주위의 풍경이 바뀌자 나무 지킴이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애초에 나무를 세상에 알리려 애쓴 그들의 처음 뜻과 달리 얄궂게 변하는 나무 주위 풍경에 정나미가 떨어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처럼 재빠르게 바뀌는 나무의 변화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탓이 더 크다.
두어 해 전만 해도 별다른 계획 없이 지나는 길에 장수동 은행나무를 찾으면, 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만나 편안하게 나무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무 그늘에 놓인 긴 의자에 홀로 앉아서 나무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라치면 어느 틈엔가 알은 체를 하며 다가오는 지킴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나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무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말았다. 나무 앞에 가만히 서서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이 앓고 있는 유일한 피부병은 인간”이라고 한 니체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마치 140년 전에 이미 오늘을 내다본 듯한 니체에 대거리할 재주가 없다. 누구보다 나무를 아꼈지만,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장수동 은행나무의 가을이 그렇게 쓸쓸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아도 잎에는 언제나처럼 천천히 노란 단풍이 내려앉는다.
글 사진 인천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gohkh@solsup.com
>>가는 길
인천 남동구 장수동 63-6.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나들목으로 나가면 곧바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가 나온다. 지하차도를 지나서 이어지는 고가도로 옆길 끝의 장수사거리에서 좌회전해 800m쯤 가면 왼쪽으로 대공원 후문을 지나게 된다. 다시 800m쯤 직진하면 만의골 입구 삼거리. 여기서 좌회전해 1.9㎞ 가면 삼거리다. 삼거리 모퉁이에 새로 지은 주차장이 있고 그 안쪽에 은행나무가 있다.
2010-11-11 21면